[카드뉴스]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를 사로잡다: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이용국가에서 전체 1위를 달성하고 전 세계에 달고나, 딱지 열풍을 일으킨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세계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1.10.07 | 조회수 1,792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신 속의 한국
전체 572건
페이지 18 / 58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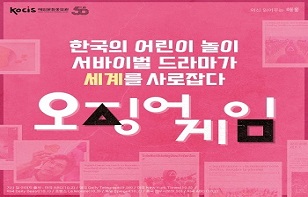 상세보기
상세보기 -
 상세보기
상세보기[글로벌 이슈 브리프 9호] 사이버 보안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커져가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이슈 브리프 9호에서는 사이버 공격의 현황과 대처 방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세계적인 싱크탱크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시각을 글로벌 이슈 브리프에서 알아보세요! 2021.10.07 | 조회수 1,267 -
 상세보기
상세보기[카드뉴스] 세계 유명 갤러리들, 한국에 속속 진출
"갑자기 다들 서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계 유명 갤러리들이 한국에 오픈하고 세계가 서울을 매력적인 예술의 도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1.10.01 | 조회수 1,5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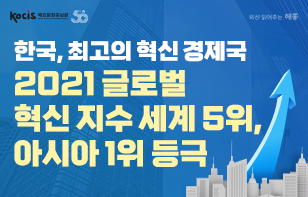 상세보기
상세보기[한 장으로 보는 외신] 한국, 최고의 혁신 경제국으로 "우뚝"
2012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5위, 아시아1위로 등극. 한국은 작년 10위에서 5위로 괄목할 상승. 특히 상표, 글로벌 브랜드가치, 문화와 창의 서비스 수출지표가 크게 상승했는데, 여기에는 K팝 글로벌 인기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1.09.24 | 조회수 1,659 -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방역-](/CONTENTS/menu0027/lang001/listImage/1631783646751.jpg) 상세보기
상세보기[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방역-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주제별로 주요 외신보도를 반추해봅니다. 2021.09.17 | 조회수 1,807 -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경제-](/CONTENTS/menu0027/lang001/listImage/1631783353142.jpg) 상세보기
상세보기[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경제-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주제별로 주요 외신보도를 반추해봅니다. 2021.09.17 | 조회수 1,724 -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외교-](/CONTENTS/menu0027/lang001/listImage/1631784470030.jpg) 상세보기
상세보기[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외교-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주제별로 주요 외신보도를 반추해봅니다. 2021.09.16 | 조회수 1,683 -
 상세보기
상세보기[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소프트파워-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주제별로 주요 외신보도를 반추해봅니다. 2021.09.15 | 조회수 1,9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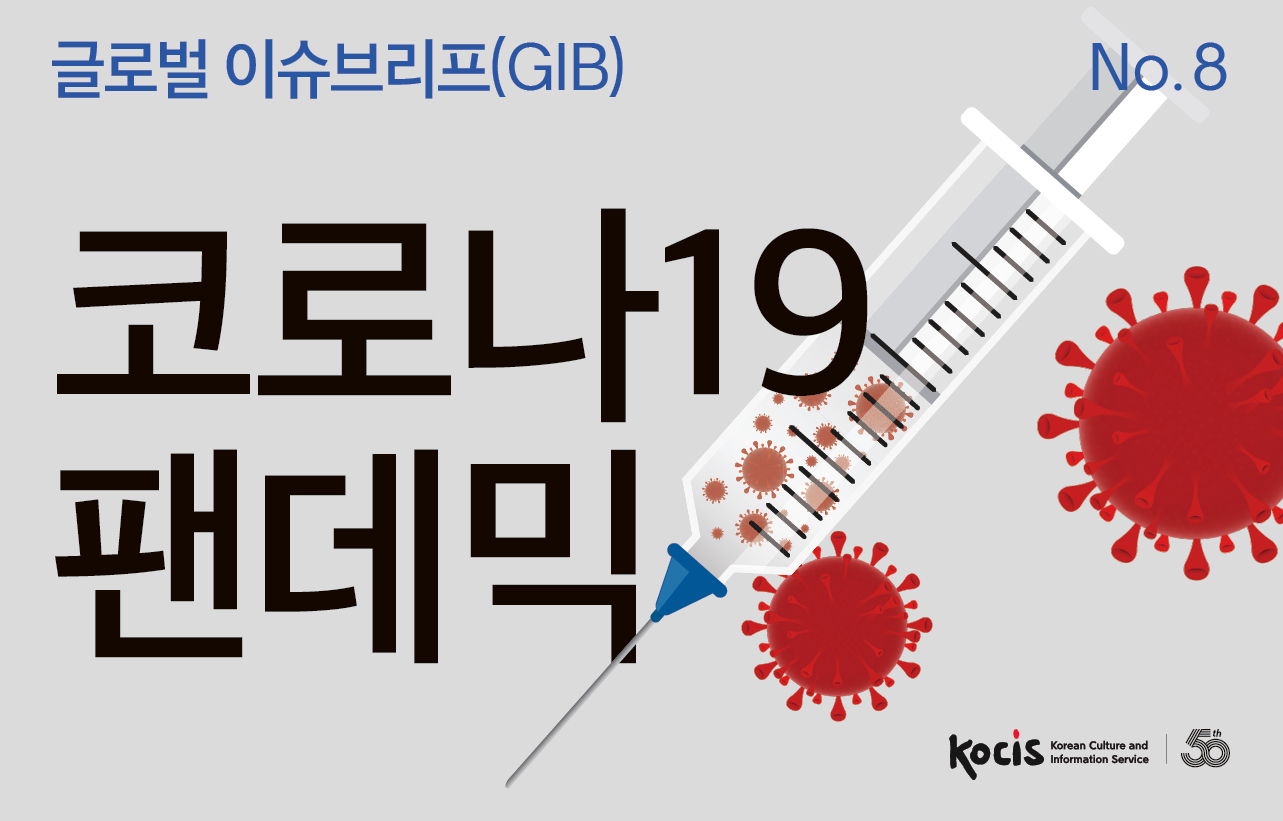 상세보기
상세보기[글로벌 이슈 브리프 8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평가 및 전망
2021.09.15 | 조회수 1,3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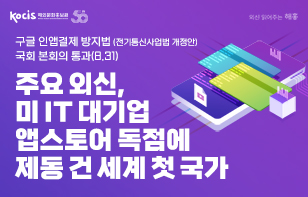 상세보기
상세보기[한 장으로 보는 외신]주요 외신, 미 IT 대기업 앱스토어 독점에 제동 건 세계 첫 국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외신이 바라본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국회 통과 그 의미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1.09.07 | 조회수 1,634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