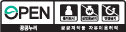- 천사 스코필드가 전한 한국 정신의 상징 ‘3.1운동’
- 2019.04.08
-

전한 기자 hanjeon@korea.kr
일러스트 = 마누스 유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 하늘에서 보내주신 천사인 것 같이 느껴왔소”1919년 3월1일 낭독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남긴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인 연당(硏堂) 이갑성 선생이 프랭크 윌리암 스코필드(Frank William Schofield, 1889~1970) 박사에 대해 회고하면서 남긴 말이다 .
3.1운동이 일어날 것임을 통보 받은 유일한 외국인
일제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목도하고 동정하던 스코필드 박사는 마음으로부터 한국인들을 사랑하게 된다.
한국인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던 스코필드 박사는 3.1운동 하루 전인 2월28일 저녁 이갑성 선생으로부터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가 있을 것임을 들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의 사본을 영어로 번역해 백악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3월1일 오전 다시 찾아온 이갑성 선생으로부터 오후 2시까지 탑골공원에서 있을 대규모 학생 시위현장의 사진을 찍어 줄 것을 부탁 받았다.
소아마비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탑골공원까지 갔던 스코필드 박사는 군중들의 “대한독립 만세!” 외침과 함께 정문을 통해 나오는 대열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그리고 종각, 광화문을 거쳐 덕수궁 대한문(大漢門)까지 이른 군중을 따라 갔다. 한 쪽 다리와 팔의 불편함 잊고 대한문 맞은편 높은 곳에 기어올라가 촬영을 했던 스코필드의 열정은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전하고 있다.

▲ 프랭크 윌리암 스코필드 박사가 1919년 3월 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촬영한 '3.1 만세운동' 모습. 독립기념관
스코필드는 3.1운동 직후 자행된 ‘제암리학살사건’도 기록에 남기고 세상에 알렸다.
발안 장날 만세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1919년 4월15일 오후 일본 군경이 마을에 들어가 15세 이상 남자를 제암리교회에 모은 뒤, 총을 쏘고 불을 질러 부녀자 2명을 포함한 23명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17일 듣고 바로 다음날인 18일 현장을 찾았다.
스코필드가 작성한 보고서 ‘제암리의 대학살(The Massacre of Chai-Amm-Ni)’은 1919년 5월 27일자 중국 상하이에서 발간됐던 영자신문 ‘상하이 가제트(The Shanghai Gazette)’에 게재됐다. 그리고 같은 무렵 작성한 ‘수촌 만행 보고서(Report of the Su-chon Atrocities)’는 미국에서 발행되던 장로회 기관지 ‘프레스비테리안 위트니스(Presbyterian Witness)’ 1919년 7월 26일자에 실렸다.
전면에 나서서 활동한 외국인 독립운동가
일제치하의 조선에서 서슬 퍼런 총칼을 앞세운 일본군경의 고압적인 감시를 받던 외국인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공개적으로 일본총독부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항의를 하는 것은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기도 했다.
스코필드 박사는 주저하지 않고 전면에 나섰다.
3.1운동 직후인 1919년 5월 일본 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던 ‘서울프레스’가 독립운동가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했던 것으로 유명한 서대문형무소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자 이를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서대문형무소를 직접 찾아 여자감방 8호실에 수감돼 있던 노경순(당시 세브란스병원 간호사)와 함께 유관순, 어윤희 등을 만나 위로했다.
참혹한 서대문형무소의 실상을 목도한 스코필드 박사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이애주 양에게 감옥에서의 고문과 학대가 얼마나 가혹한 지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를 찾아가 감옥 환경 개선과 함께 고문 및 비인도적 만행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스코필드 박사는 일제의 비인도적 만행들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데 힘을 쏟았다.
스코필드 박사가 쓴 글과 사진은 1919년 미국 기독교연합회에서 발행한 ‘한국의 상황(The Korean Situation)’, 상해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영문 사진첩 ‘한국 독립운동(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에 실렸다. 또 스코필드 박사가 찍은 사진은 1919년 7월17일 미국 국무부장관에게 보내진 보고서에도 첨부됐다.
스코필드 박사의 활동은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았다.
1919년 8월 일본으로 건너간 스코필드 박사는 선교사 8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제의 만행을 비난하는 연설을 했고 당시 수상이었던 하라 다카시(原 敬)와 면담을 갖고 비인도적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하라 총리는 1919년 8월 29일자 일기에 스코필드를 만난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
그런 스코필드 박사의 활동은 일제에게는 눈엣가시 였다.
일제가 스코필드 박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캐나다장로회 해외선교부 보고서(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에도 간접적으로 잘 드러나있다.
보고서에는 “당연히 고문과 구타와 악행 등을 다루는 (스코필드 박사가 작성한) 기사들을 경찰들이 매우 싫어하였고, 이것은 일본 경찰이 그 필자를 심하게 공격한 것을 설명해 준다”며 “어떤 사람은 총독이 스코필드 박사를 ‘교활한 음모자요 굉장히 위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단언했다”고 기록돼 있다.

▲ 지난 1958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노천강당에서 개최됐던 프랭크 윌리암 스코필드 박사 환영회 모습.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스코필드 박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석호필(石虎弼), 마지막까지 한국 정신의 상징 ‘3.1운동’을 강조하다
1920년 캐나다로 돌아간 스코필드 박사는 1926년과 1931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보낸 편지에서 “조선은 나의 고향과 같이 생각됩니다”, “나는 ‘캐나다인’이라기보다 ‘조선인’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적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또 그는 자신의 성인 ‘스코필드’ 발음을 따라 지은 한국식 이름 ‘석호필(石虎弼)’로 불러 주는 것을 좋아했다.
돌과 같이 강하고 굳세 호랑이의 마음으로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뜻을 담은 그의 이름 ‘석호필’처럼 스코필드 박사는 1970년 4월12일 81세를 일기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서거하기 전까지 한국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3.1운동을 알리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삶을 바쳤다.
▲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 '한국의 독립운동과 캐나다인'이 지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시티갤러리에서 열렸다. 기념전시에서는 프랭크 윌리암 스코필드 박사를 포함 한국의 독립을 도운 5명의 캐나다인과 관련한 글, 사진, 영상 등이 전시됐다. 전한 기자
1958년 한국으로 돌아온 스코필드 박사는 1960년 대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1919년 3월 1일과 1963년 3월 1일(1963)’, ‘1919년 3월 1일, 삼일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1966)’, ‘하나로 뭉친 독립만세(1969)’, ‘3.1운동은 한국 정신의 상징(1969)’ 등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을 것을 권고하는 수 많은 기고를 했다.
한국인, 그리고 3.1운동에 대한 그의 끝없는 사랑은 서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병상에서 전한 글에서도 가감없이 드러나 있다.
스코필드 박사의 마지막 3.1절이었던 1970년 3월 1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한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그는 “’1919년 당시의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진 커다란 빚을 잊지 마시오.’”라며 “이 몇 마디는 내가 오늘의 조선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불의에 항거해야만 하고 목숨을 버려야만 할 때가 있다”며 “그럼으로써 일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조금은 광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석호필 박사가 그의 마지막 3.1절에 당부한 이 말은 반 세기가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에게도 잔잔한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 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ubMenu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